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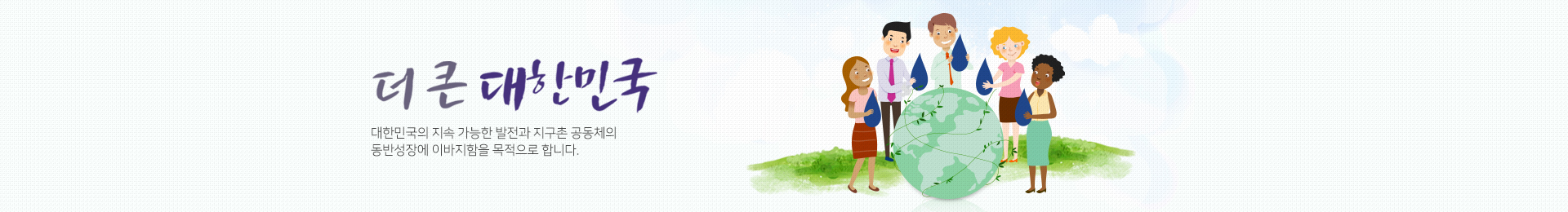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무려 147개국 정상이 모인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취임 이래 세 번째로 소집한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겸해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116개국이 참여했고,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 정상회의에 124개국 정상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단연 역대급이다.
유엔 역사상 최대 규모 정상회의가 이처럼 열리는 까닭은 선진·개도국의 이분법을 넘어 2020년부터 `모든 국가에 적용될(applicable to all Parties)` 신(新)기후 체제 최종 협상이 이번 파리 총회(COP21)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파리 총회를 열흘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 기후에너지콘퍼런스 축사에서 "화석연료 위주인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을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탈(脫)탄소화하는 것이 공동 의무"라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파리는 18세기 프랑스혁명에 이어 21세기에도 `앙시앵 레짐(구체제)`과 작별을 고하는 역사의 장이 될 것인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 달리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시선의 가장 큰 논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11월 파격적인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파리 총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전례 없는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슈퍼 차이나`를 기획한 후안강 칭화대 교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이를 `중·미 기후연합`으로까지 표현했는데, 이번 총회를 앞두고 170개 넘는 국가들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것도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그리드로 연결되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에너지 혁명 2030`을 저술한 토니 세바는 "미국의 경우 20년 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나 자동차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 교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된 중국은 이제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녹색성장을 13차 개발계획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파리 회의에는 난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금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묶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170여 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합쳐도 2도 목표 달성에는 태부족이라고 전한다.
2020년부터 1000억달러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것인가도 주요 현안이다.
가장 큰 고민은 이번 파리 총회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 합의로 귀결될 것이냐에 있다. 코펜하겐 총회가 실패로 돌아간 까닭은 주권 국가를 국제법적으로 구속하는 기후체제(legally binding regime)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유엔이 이번에 자발적 기여 방식을 통해 주권 국가 재량을 존중하고 나선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개별 국가에만 맡겨 놓으면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총량적 노력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살기 힘든 세상을 피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유엔을 통한 규율과 개별 국가의 자발적 노력이 서로 타협하는 `하이브리드 체제`가 이번 파리 회의의 현실적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제3의 길`을 주창한 앤서니 기든스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도전에 글로벌한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단기적 포퓰리즘에 치중하는 국내 정치적 속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 총장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까닭은 결국 그런 정치의 극복을 호소해 글로벌 공공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나폴레옹은 총과 대포로 프랑스혁명의 격동기를 이끌었지만 반 총장에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번 파리 총회의 현주소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113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