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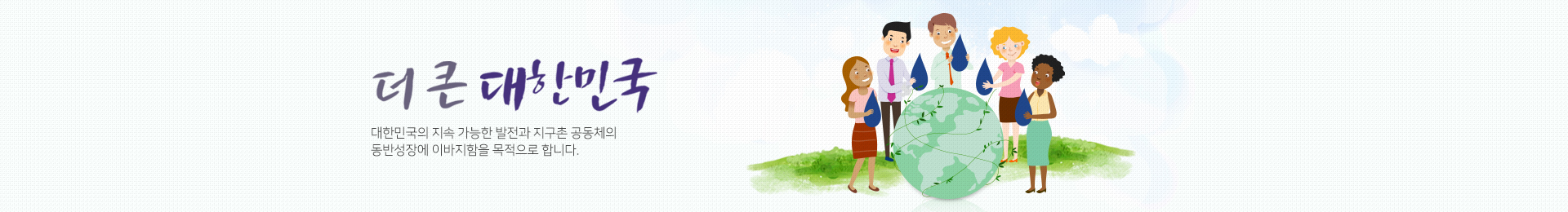
보름에 걸쳐 진행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1)가 그 역사적 소임을 이뤘다. 예정보다 하루를 넘긴 12일 밤(현지시각) 총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파리협정문(Paris Agreement)’ 채택을 선언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역사가 파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이를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혁명적 행위(revoutionary act)’로 지칭했다. 달 착륙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의 표현에 빗대 “인류를 위한 도약(major leap)”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2006년 취임 이래 세 차례에 걸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하며 승부수를 건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인류와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거둔 기념비적 승리”라며 “이제야 손주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설익은 이야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오해도 많은 것 같다.
1. 한국, 선진-개도국 이분법에 기댈 여지 사라진다
한국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의 선진-개도국 이분법을 십분 활용해왔다. 필자 역시 ‘한국은 한국이다’ 또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논리 등으로 한국을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분류하려던 국제사회의 외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었다. 국내 준비 기간을 최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 2020 新 기후체제 출범이 파리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분법에 기대는 ‘편의’는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로버트 스태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가 선진-개도국의 이분법을 만들어 기후 협상의 교착 구조를 잉태했다면, 이번 파리 협정 타결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걸 깨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앞으로 싫든 좋든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못지 않게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입장(in a position to do so)’에 서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일부 부처에서 한국이 파리 회의 이후 개도국으로 여전히 남게 됐다고 이야기한 것은 시대착오적 인식이거나 임시방편을 위한 호도일 수 있다. 냉정해져야 한다.
2. 1.5도가 아니라 2.0도 이내가 파리협정의 타깃... 이마저도 실현 어려워
국내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 중 하나가 파리 총회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금세기 내에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묶기로 합의했다고 한 대목이다. 정확한 표현은 이를 위해 노력(strive)하겠다는 것이며, UN의 목표는 여전히 2.0도 이내로 묶는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마저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 과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에 180개가 넘는 국가가 제출한 온실가스 자발적 기여(INDC) 계획을 모두 실현한다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2.7도 이상 오르게 되리란 전망도 있다.
파리에서 만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핵심 관계자는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는다 해도 오래 머무는 이산화탄소의 특성상 2030년이면 지구 온도는 1.2도 상승을 넘어설 것”이라며 “1.5도는 물론 2도 목표도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레토릭(수사법)”이라 단언했다.
그렇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이런 수치가 최종 발표문에 포함된 것일까? 수몰위협에 처한 국가들을 달래기 위한 협상용 긴급처방이었다는 게 UN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관한 언급을 넣는 대신, 이 언급이 보상과 소송 등 선진국의 법률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온실가스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고삐는 더 정밀하게 조여질 수 있다.
3. 파리 협정의 법적 구속력,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이번 파리협상의 최종결과물은 의정서(protocol)와 같은 조약이 아니라 협정 혹은 협약과
같은 합의문(agreement)을 발표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국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협상 막판에 ‘shall’ 이냐 ‘should’냐 라는 단어 하나로 첨예한 신경전이 오고 가기도 했다.
파리 합의문은 각국 여건에 따라 비준, 수용,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국제법적 구속성(internationally legal bindingness)’ 여부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다.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나 재정지원의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나 영향을 고려해 국제법적 구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돼있다. 이는 외압을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중국은 물론, 폐쇄적 의회의 영향력이 큰 미국의 입장을 다분히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각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INDC) 제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후퇴 방지, 그리고 정기적 검증(review) 등에 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규율하게 돼있다. 이걸 혼동해선 안 된다.
4. 대충 하다간 걸린다. 유념해야 할 5년 단위 리뷰 메커니즘
반기문 총장은 총회장 집무실에서 가진 필자와의 면담에서 이번 파리 기후총회가 성공했다고 보는 이유로 5년 단위의 ‘리뷰 메커니즘 (review mechanism)’을 꼽았다. 각국이 제출한 INDC가 과연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감축 목표는 합당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UN과 국제사회가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기후변화에 대한 ‘총량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8년, 사우디 아라비아는 10년 단위의 검증기간을 제시하며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반 총장의 의지가 관철됐다. 2020년이면 한국이 이번에 제출한 INDC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제출한 배출전망치(BAU)가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에 나올 글로벌 총량접근(global stock taking)은 IPCC의 점검을 바탕으로
2023년에 그 적절성을 검증 받게 됐다. 파리 협정은 각국의 재량을 존중하는 느슨한 형태로 출발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관리체계)는 갈수록 타이트해질 것이란 뜻이다.
UN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은 제출한 INDC에 대한 합리적 논거(rational)와 실증자료,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상당히 깊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상당히 야심찬 목표와 방안이라고 주장했던 37%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5. 결국 관건은 누가 녹색산업혁명의 승자가 되느냐에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년 전 상원에서 IT 분야를 담당했을 때 오늘날 이처럼 인터넷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산업의 발전 양상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스턴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이번 파리 협정은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혁명을 가져올 것”아라며 “에너지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 21 주최국인 프랑스의 제롬 비뇽 상원의원은 “프랑스는 올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성장법을 만들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웨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는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후변화를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삼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개발이 중국 미래전략의 핵심”이라며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기후변화라는 도전을 누가 어떻게 기회로 반전시킬 주역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149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