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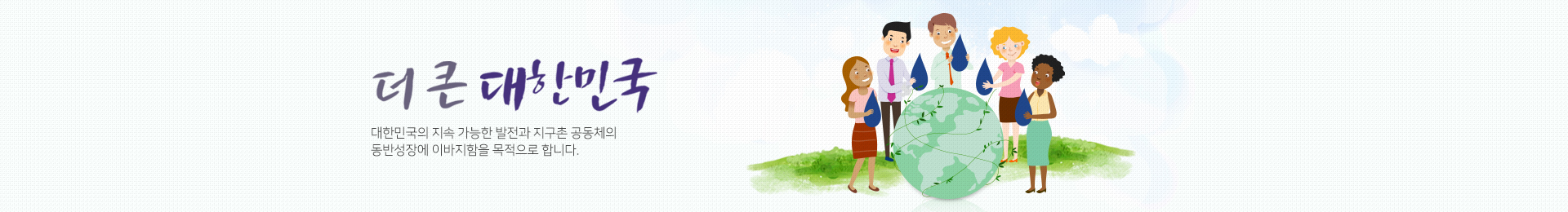
프랑스 외교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10일(현지시각) 오후 11시 30분. 파리 외곽 ‘르 브루제(Le Bourget)’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 등장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이제 협상은 결승선에 거의 확실히 다가섰다(extremely close to the finish line)”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대신해 파리 기후총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파비우스 장관은 “(협상 마감 시한인) 내일이면 협상 최종안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바퀴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전날 밤샘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3시에 속개되기로 했던 총회 시간이 갑자기 저녁으로 변경되자 “이러다가 실패로 돌아간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장내에 퍼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총리를 지낸 경륜의 파비우스 장관은 그 사이 기동력을 발휘하며 이견을 보이는 국가들과 맨 투 맨 식으로 긴밀히 교섭했고, 상당 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파비우스 장관을 ‘친구’로 표현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은 이제 내용보다는 표현(language)의 문제가 남은 것과 같다 ”고 말했다.
협상이 본격화된 시점의 초안에는 이견 또는 추가 의견을 뜻하는 ‘괄호(bracket)’에 1600개가 넘는 아이템이 있었다. 지난 수요일에는 361개로 줄었고 이제는 50개 남짓한 상황이다. 최재철 기후변화 대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클린 페이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리마에서 열린 기후총회(COP20)가 폐막 시간을 36시간 넘겨가며 지루한 협의를
계속했던 것에 비하면 ‘괄호’가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돈이 핵심 쟁점
◆돈이 핵심 쟁점
그렇다면 파리총회는 이제 정말 문턱을 넘어선 건인가?
총회 행사장에서 만난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돈(finance) 문제가 핵심으로 남았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치열한 기 싸움은 결국 돈을 조건으로 서로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등 선진국에서는 이번에 개도국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을 매 5년마다 ‘검토(review)’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말이 부드러워 ‘검토’지 사실은 개도국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태를 면밀히 추적하고 점검해 발표하면서 점점 구속력을 높여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대다수 개도국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개도국 대표는 “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 동안 온실가스 관리 체제를 갖춰왔는데, 이제 막 관리를 시작하려는 우리가 어떻게 5년마다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렇게 검증을 원한다면 관련 비용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선진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들은 또 新기후체제가 출범하는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조성키로 한 기후재정(climate finance)에 대해서도 그것이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minimum) 1000억 달러 이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1.5도’ 목표도 유사한 맥락이다. UN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는 있지만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를 비롯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몰린 열도 국가들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1.5도 이내’로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아예 귀국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을 내놓고 있다.
어차피 2도가 상승하면 그때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테니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 있지만, 전 세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총회 공개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어난 8억6000만 달러(약 1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달래고 나선 배경이다.
◆ 결국 성공했다고 평가 받을 파리 총회
따져보면 하나 하나 쉽지 않은 난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파리총회는 결국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각국 정상을 소집했다. 그런데도 아무 결실이 없다면 그건 인류 전체의 수치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성공으로 부르자는 의견에 상당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다음 회의로 미루고 이번엔 어떻든 ‘합의서(agreement)’라고 부를 만한 결과물을 내놓는데 ‘합의(agree)’하자는 얘기다. 벌써부터 ‘파리 이후(Apres Paris)’가 주목 받는 이유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1/2015121102390.html
